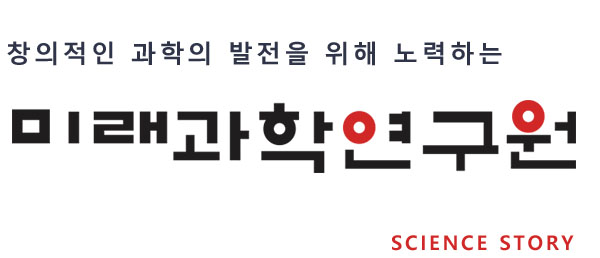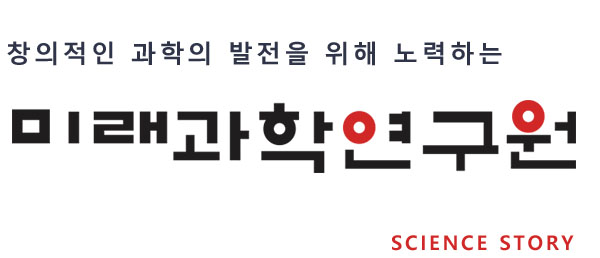한범덕 고문 (전 청주시장)
허만 멜빌의 모비딕을 읽었습니다.
거대한 흰고래와 에이 허브라는 포경선 선장과의 사투를 그린 소설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나 줄거리는 단순해서 읽지 않았는데 1월이라 시간이 나서 읽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등장인물과 18세기 풍경 등이 낯설었지만 다인종, 다문화가 어우러진 고전이었습니다 .
여기서 저는 왜 그 당시에 고래를 잡는 일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래기름이었습니다. 고래기름은 당시 중요한 램프의 연료였습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올라서는데 불의 발견은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 그중에서도 불은 야간에 빛을 내어 생활의 영역을 넓힌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나무를 태워 어둠을 밝히고, 음식을 익히며 추위를 견디는 난방의 역할까지 중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잠을 자야 하는 밤에 활동할 수 있게 한 조명기능 또한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나무를 묶는 횃불이나 커다란 그릇에 불씨를 담은 화로에서 돌내부를 파내거나 조개껍질 등을 이용한 간단한 형태의 등잔이나 램프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족들이 사용한다는 돌등잔은 BC 7만 년 전 구석기시대 돌내부를 파서 동물기름을 적신 이끼에 불을 붙인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8천 년에서 7천 년 사이 메소포타미아지방에서 등잔이 사용되었습니다. BC 2700년경에는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돌과 조개 등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것이 금속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연료는 초기에는 단순히 나무를 태우다가 기름 많은 열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말에서 보듯 점점 연기가 나지 않고, 그을음이 없는 램프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연료는 올리브였습니다. 당시 올리브 20개로 올리브오일 1스푼을 얻어, 5시간 불을 밝히려면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올리브농사가 아주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올리브는 페르시아문명의 중심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20년을 키워야 하는데다 넓은 면적이 소요되어 올리브기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식물성 기름을 태워 빛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위킹(wicking)’이라는 기술이 돋보였습니다. 기름에 심지를 넣어 액체인 기름의 표면장력현상으로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 오랜 시간 일정하게 밝히는 원리가 되어 거의 ‘등유’가 나오기까지 천년 정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화점이 더 낮은 기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래기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고래기름은 고래의 지방조직을 끓여서 만듭니다 . 인화점이 섭씨 315도인 올리브기름보다 낮은 섭씨 230도로 오일램프의 연료로는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래기름의 수요는 18세기 후반 들어 급증하였습니다. 1770년에서 1775년 사이 미국 매사추세츠의 포경꾼들이 생산한 고래기름은 매년 4만 5천 배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내조명은 더욱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 고래를 잡는 포경산업은 큰 산업이 되었고, 급기야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 고래포획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고래를 식용으로 그렇게 많이 먹었나 생각하였던 것이 이처럼 실내조명을 위하여 많이 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고래의 수난은 곧이어 나온 등유를 사용하는 오일램프와 전기의 발명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멸종위기 고래의 회복은 어려운가 봅니다. 모비딕을 읽으면서 고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 미래과학연구원 -
|
|